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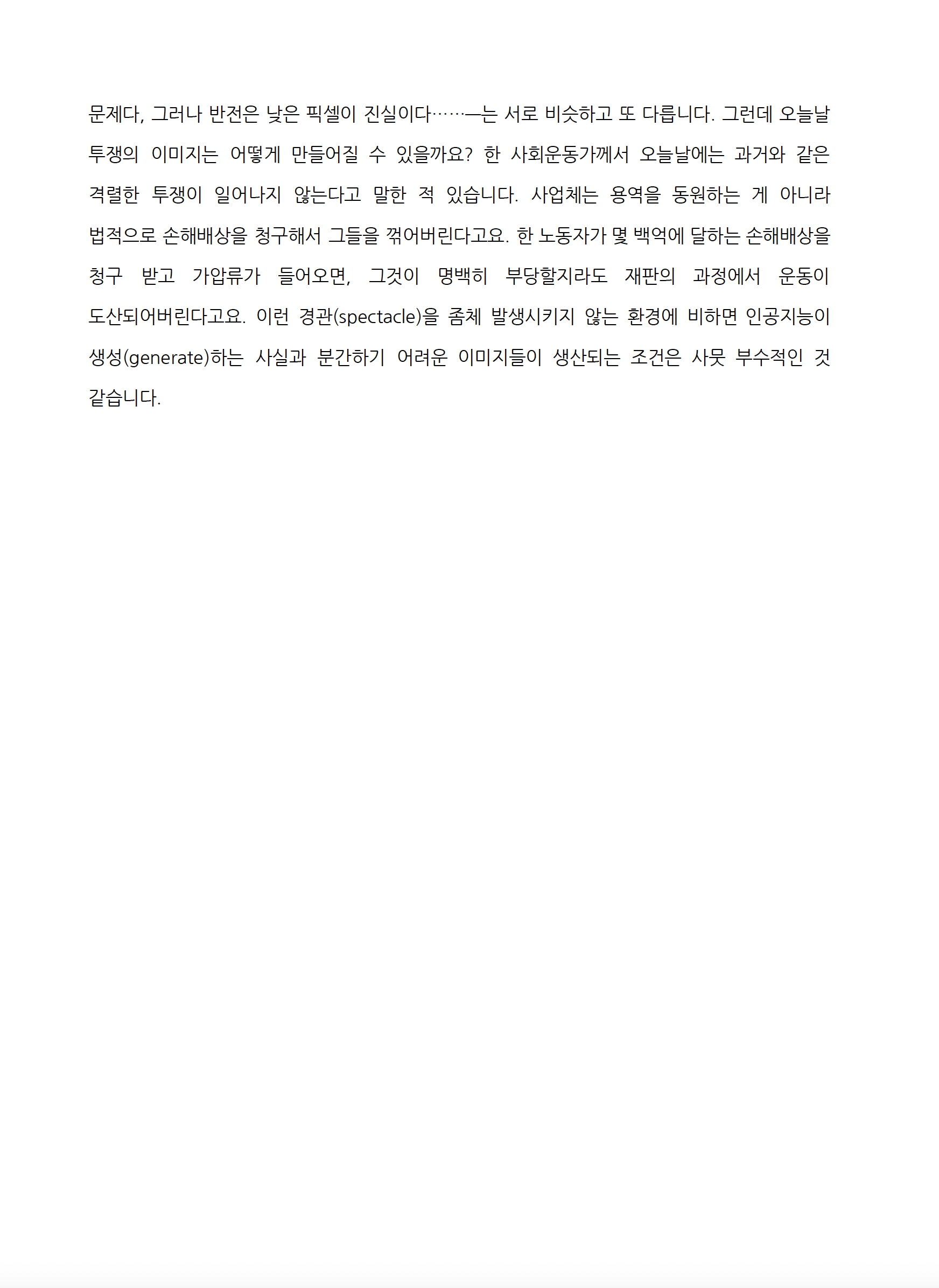
전체 글
- 멜팅아이스크림 _ 평론 금동현 2024.09.21
- <사상>(2020) 2020.10.20
- 오지필름과 그냥혜린 이라는 사람. 2020.08.02
- 34회 다큐, 싶다_<기프실> 2018.12.20
- 33회 다큐, 싶다_<국가에 대한 예의> 2018.12.20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2018.12.20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2018.12.20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2018.12.20
멜팅아이스크림 _ 평론 금동현
<사상>(2020)

한국 / 2020 / 다큐멘터리 / 129분
기획의도 Directors comments
30년 동안 살고 있는 사상을 9년 동안 지켜봤다. 집들의 무덤 위에서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사상에는 일터를 잃은 성희와 공동체를 지키지 못한 수영이 살고 있었다. 한때 산업역군이라 불렸던 두 가부장은 우울을 안고 마치 유령처럼 사상을 배회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자본의 악랄함을 확인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사상>은 긴 시간 꼬리처럼 따라붙던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다.
Sasang is my hometown of 30 years, and a place that I have been observing for nine years. Sung-hee and Su-young are residents of Sasang, where funerals are held on a daily basis on the graveyards where homes are buried. One has lost his job, and the other failed to keep his community together. The two patriarchs, who were once called the “pillars of industry,” now roam the town of Sasng like ghosts, defeated and depressed. Watching their lives unfold, I have witnessed the vicious nature of the Capital that constantly builds castles of sand only to tear them down. Then, I would ask myself, what should I record, and how? Sasang – The Town on Sand represents my journey looking for answers to this question that has been following me around for all these years.
시놉시스 Synopsis
끊임없이 착취가 벌어진 성희와 수영의 '삶'과 '몸'.
자본이 숨기려고 했던 노동과 지우려고 했던 존재들.
그들을 품고 있는 ‘사상’.
자본이 할퀴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배인 사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풍경처럼 펼쳐진다.
The lives and bodies of Sung-hee and Su-young have been sites of ceaseless exploitation.
The Capital tried to render their works invisible, and erase their very existence.
And Sasang embraces the two people and their lives...
This documentary unfolds the lives of those who live in Sasang, the “Town on Sand,” which preserves the scars left by the claws of the Capital.
크레딧 Credit
기획 제작 오지필름
프로듀서 김일권
출연 박성희, 최수영
감독 박배일
촬영 박배일 문창현 김민우
편집 박배일
음악 Awan
음향 김동완
스틸컷 Still Cut





'메이드 인 오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ast Scene>(2018) (0) | 2018.10.07 |
|---|---|
| 기프실(2018) (2) | 2017.09.11 |
| 소성리(2017) (1) | 2017.09.08 |
| 깨어난 침묵 (2016) (0) | 2016.02.17 |
| 밀양 아리랑(2014) (0) | 2014.09.03 |
오지필름과 그냥혜린 이라는 사람.
1.
오지필름과 함께 하게 된 지도 벌써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듯 아닌 듯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어쩌면 천만의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마냥 영화를 하고 싶었던 무지한 사람이
영화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서 걸었던 오지필름의 날들을 생각합니다.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운이 좋았구나.
2.
오지필름과 함께 한 다섯 달 동안은
나를 좀 더 살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떤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혹은 그 과정을 거치며
새로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한.
목소리를 가지는 일
목소리를 내는 일
여태 다양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어딘가 비어있는 나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없지만 조금은 나 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것도 같습니다.
3.
좋은 영화를 만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의심이 앞선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어 고맙습니다.
그때의 순간과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살게요.

그냥혜린
'오지 > 오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미와 함께!!!! (0) | 2013.11.12 |
|---|---|
| 오지인, 이승훈 받으십시오! (0) | 2011.03.15 |
| 오지인 (4) | 2011.02.01 |
34회 다큐, 싶다_<기프실>
34회 다큐, 싶다
2018년 1월 23일 / 국도예술관
기프실 2018
감독 ㅣ문창현ㅣ 다큐멘터리 ㅣ 93분
기획의도 국책사업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국가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 할 것인가?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이후 나의 카메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 할머니가 살던 기프실은 강물이 굽이굽이 돌다 여울은 만들어 가장 깊게 잠기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의 기억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굽이굽이 돌아 검게 잊히게 마련이다. 국가 폭력이 반복 되고 잔인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잔인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며 저항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역할이다. <기프실>은 영주 댐으로 사라질 마을을 기록하여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나의 첫번째 여정이다. |
시놉시스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 1리. 내성천이 굽어 흐르는 마을 기프실에는 할머니 댁이 있다.
강가의 모래로 성을 쌓고 내성천 맑은 물을 찰방이던 어린 날의 기억이 무색하게 마을은 변해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영주댐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떠나면서 10가구 남짓만이 남은 기프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기한 없이 미뤄지는 이주를 앞두고도 뜯겨난 땅에 또다시 삶을 일구고, 떠나가는 이웃을 배웅하며 함께 생활한다. 나는 그분들과 섞여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가는 기프실의 모습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다. 그리고 검은 물속으로 잠기는 마을과 마음을 보며 내 안에 숨겨둔 기억을 꺼낸다.
크레딧
기획 제작 오지필름
출연 김노미 하귀분 문제규 박종숙 이영옥 석오길 권순자
감독 문창현
프로듀서 박배일
촬영 문창현 김주미 박배일 이승훈 주강민 한동혁
구성 김주미 문창현 박배일
편집 문창현
출처 : 오지필름 블로그
'다큐, 싶다 > 상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3회 다큐, 싶다_<국가에 대한 예의> (0) | 2018.12.20 |
|---|---|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0) | 2018.12.20 |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0) | 2018.12.20 |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0) | 2018.12.20 |
| 29회 다큐, 싶다_<빨간 벽돌> (0) | 2018.12.20 |
33회 다큐, 싶다_<국가에 대한 예의>
33회 다큐, 싶다
2017년 12월 19일 / 국도예술관
국가에 대한 예의 Courtesy to the Nation , 2017
감독 ㅣ권경원ㅣ 다큐멘터리 ㅣ 90분

- 시놉시스
-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하던 11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모든 죽음의 책임을 스물일곱의 강기훈에게 전가했다.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방조했다는 사법사상 유일무이한 혐의였다.
최종 무죄가 선고된 것은 24년이 흘러서였다. 진범은 국가였음이 밝혀지던 순간 그는 간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스무 해를 넘도록 되풀이해야 했던 말들을 멈추고, 기타를 들었다. 그리고 1991년 살아남았던 또 다른 젊은이들이 봉인해 둔 기억을 증언한다.

- 연출의도
- '삶이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들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기억하는 방식이다.' 부박한 역사 속 개인의 고독을 마법처럼 풀어낸 소설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의 자서전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올해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주년, 지금의 이 시간의 삶들이 1987년 이한열의 죽음 이후일 뿐만 아니라, 1991년 김귀정의 죽음 이후이기도 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면, 당시 강기훈을 포함한 허망한 죽음 곁의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견디고 기억해왔는가를 스크린까지 옮겨내는 것이 두 번째의 미션이었다. 그 미션은 제법 고된 일이었지만, 방황할 일은 없었다. 4년 전 작은 밥집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가는 것 같았던 강기훈의 기타 연주가 내게 등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 [출처 : 서울독립영화제]
'다큐, 싶다 > 상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4회 다큐, 싶다_<기프실> (0) | 2018.12.20 |
|---|---|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0) | 2018.12.20 |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0) | 2018.12.20 |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0) | 2018.12.20 |
| 29회 다큐, 싶다_<빨간 벽돌> (0) | 2018.12.20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32회 다큐, 싶다
2017년 11월 28일 / 국도예술관
스물 다섯 번 째 시간 The Memory of The 25th Hour, 2016
감독 ㅣ김성은ㅣ 다큐멘터리 ㅣ 78분

시놉시스
2015년 1월 31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관사 공사장 앞의 농성천막과 망루가 17시간의 저항 끝에 철거되었다. 주민과 연대자들이 100일 동안 함께 지켰던 이 공간은 투쟁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적으로 연결시켰던 연대의 장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미사천막과 삼거리 공동식당도 기지 확장과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
2012년 구럼비 발파를 시작으로 강정마을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해 그들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추방되어왔지만, 매일 어제와 다름없는 저항의 일상은 계속된다. 이 영화는 그 반복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시간에 주목한다. 그 시간은 강정 주민들의 지난 9년을 향한 기억의 투쟁인 동시에 그 일상 속 개개인에게는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복종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연출의도
2013년 3월, 구럼비 발파 1주년 즈음 기지 공사가 한창일 무렵 강정에 처음왔다. 많은 연대자들이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고 차차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멀어져갔다. 나의 첫 질문은 왜 이들은 끝난 싸움을 지속하는가 였다. 이후 방문자에서 연대자로 그리고 이주민으로 변해온 내 시선이 반영된 영상을 기록하려 했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장소가 사라질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기록은 시간의 매체인 영상에 보다 적극적인 기억의 역할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울처럼 반복되는 강정의 일상이 해군기지반대운동의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미래에 안주하지 않는 저항의 시간 언저리에 그 능동적 기억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노트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두고 ‘기억한다’ 또는 ‘기억하겠다’고 말할 때 우리의 기억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태가 벌어진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사태가 벌어진 바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사태 이후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그 것을 기억한다고, 기억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 얼마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재구성된 기억은 나의 기억이라 말하겠는가. 김성은 감독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을 과감하고 독창적으로 돌파한다. 감독 앞에 놓인 사태라고 하면 이것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놓고 치러진 주민 찬반 투표 이후, 제주를 지키려는 이들의 투쟁. 그 기억됨이다.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고립된 내부에서의 시간은 외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외부로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 그 고립으로 자진해서 돌아와 그 시간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그 시간의 주변에서 반복된 동선들이 만들어낸 기억이다.’ 미디어를 통해 제주 밖에서 보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대부분 비슷한 그림들일 경우가 많다. 싸우고, 소리치고, 맞서고, 막아서는 장면들의 연속. 하지만 운동의 현장 속에서는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림들이 있고 반복되는 운동 안의 변화가 있다. <스물다섯번째 시간>은 현장의 시각을 쪼개서 들여다본다. 또한 그 시각들의 나열은 순차적이지도 않다. 25시에서 13시가 됐다가 24시가 되고 10시30분 됐다가 5시58분이 되기도 한다. 매 시각마다 카메라는 제주 곳곳에서 구럼비를, 제주 강정을 해군기지 건설로부터 지키려는 이들의 운동을 기록했다. 매 시각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은 결국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어진다. 영상은 흑백이었다가 컬러가 되기도 하며 제주 강정의 지킴이들의 목소리와 감독 자신의 내레이션이 섞여있기도 하다. 영상과 사진의 콜라주, 실험극과 현장 다큐의 크로스오버도 보인다. 실제로 그때 강정의 시간이, 강정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이, 영화의 이 뒤섞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감독의 말을 빌려 보고 싶다. ‘내 몸이 피사체와 멀어질 때 나는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라진 공간을 담았던 카메라 그 프레임 밖의 기억’, ‘나에게 강정에서 산다는 것은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다른 이의 기억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다.’ <스물다섯번째 시간>의 ‘기억하기’라는 커다란 질문에는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포함됐다. 기억을 하는 존재로서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것이다. 강정의 원 모습은 사라진 현재, 강정은 감독의 말대로 ‘개개인의 몸 속에 각인된 시간’으로서 기억되고 있다.
인디다큐페스티발2017 프로그래머
정지혜
[출처 : 인디다큐페스티발2017 홈페이지]
'다큐, 싶다 > 상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4회 다큐, 싶다_<기프실> (0) | 2018.12.20 |
|---|---|
| 33회 다큐, 싶다_<국가에 대한 예의> (0) | 2018.12.20 |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0) | 2018.12.20 |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0) | 2018.12.20 |
| 29회 다큐, 싶다_<빨간 벽돌> (0) | 2018.12.20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31회 다큐, 싶다
2017년 10월 31일 / 국도예술관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A Clean, Well-Lighted Place , 2016
감독 ㅣ고재홍ㅣ 다큐멘터리 ㅣ 22분

시놉시스
한 영문학과 교수가 내게 말했었다. ‘문학이 삶의 지도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사회의 풍경 속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학의 문장들이 겹쳐져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자주 길을 잃었고 답답한 마음에 교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연출의도
어느 날 신문을 펼쳤다. ‘20대 조울증 환자 급증’, ‘해마다 신입생의 음주로 인한 사망 증가’, ‘한 고시생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 어느 날 지하철을 타러 갔다. 직장인들의 다리 사이로 더덕 껍질을 벗기던 할머니가 공무 요원에게 끌려가고 요한 계시록을 나눠주던 여자가 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을 꿨다.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서 있는 꿈이었다. 어떤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삶은 어리석은 자에 의해 쓰여 졌다’, ‘당신들은 길을 잃은 세대요’, ‘모든 것이 허무 그리고 허무 그리고 허무였다.’ 대학교 시절 영문학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이었다.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과 과거에 읽었던 것들을 부딪쳐 보고 싶었다. 그것을 통해 길을 찾고 싶었다.
[출처 : 서울독립영화제]
일 The Work, 2016
감독 ㅣ박수현ㅣ 다큐멘터리 ㅣ 21분

콘크리트의 불안 Anxiety of Concrete , 2017
감독 ㅣ장윤미ㅣ 다큐멘터리 ㅣ36분

'다큐, 싶다 > 상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3회 다큐, 싶다_<국가에 대한 예의> (0) | 2018.12.20 |
|---|---|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0) | 2018.12.20 |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0) | 2018.12.20 |
| 29회 다큐, 싶다_<빨간 벽돌> (0) | 2018.12.20 |
| 28회 다큐, 싶다_<변방에서 중심으로> (0) | 2018.12.20 |
30회 다큐, 싶다_<옵티그래프>
30회 다큐, 싶다
2017년 9월 25일 / 국도예술관
옵티그래프 Optigraph , 2017
감독 ㅣ이원우ㅣ 다큐멘터리 ㅣ 104분

시놉시스
외할아버지의 백수(99세) 잔치가 끝난 후, 손주 대표로 생일카드를 읽은 나는 할아버지에게 자서전을 의뢰받는다. 2년 후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부탁은 숙제로 남았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며 연관 짓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필름메이커가 된 나는 나의 삶과 멀었던 이들의 장례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다. 가족의 일로 미국에 잠시 살게 된 나는 국가와 국적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연출의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기억은 늙고, 검소하시고, 자상한 어른이였다. 하지만 검색한 그의 이름은 OSS특수요원, 한국전쟁이 시작되던 당시 치안국장등으로 낯설었다.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고 혹 되지 못할때 그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가는 국민을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지키며, 지켜주지 않으며 또 기억하고, 잊게 되는가를 자꾸만 묻게 되었다.

리뷰
<옵티그래프>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CIA의 전신인 O.S.S 요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치안국장으로 활동했음을 알게 된 감독의 이야기다. 감독은 외할아버지의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을 인터뷰하는 대신 자신만의 해법을 찾기 시작한다. 출발이 되어준 것은 버마와 인도, 한국 등 세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장식품이다. 친구들과 무작정 버마로 떠난 감독의 여정은 ‘외할아버지’라는 분명한 목적을 종종 벗어난 여행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에게 문장가가 되라고 하시며 자서전을 부탁하신 외할아버지의 유언은 여정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감독의 여정은 할아버지의 부끄러운 행적을 파헤치는 동시에 할아버지를 위한 자서전을 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폭로와 미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감독은 확장과 질문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낸다. 그것은 때로는 독일에 있는 북극곰이 독일 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질문으로도, 혹은 과연 명령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도 나타난다. 그녀의 질문은 종종 할아버지의 선택을 옹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것도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다. 그녀가 영화 만들기를 은유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법적 선택 대신 다른 길을 찾아낸 결과물인지는 관객의 판단으로 남겨진다. [김소희]

-사진 및 정보 출처 :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다큐, 싶다 > 상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2회 다큐, 싶다_<스물 다섯 번째 시간> (0) | 2018.12.20 |
|---|---|
| 31회 다큐, 싶다_<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일>/<콘크리트의 불안> (0) | 2018.12.20 |
| 29회 다큐, 싶다_<빨간 벽돌> (0) | 2018.12.20 |
| 28회 다큐, 싶다_<변방에서 중심으로> (0) | 2018.12.20 |
| 27회 다큐, 싶다_<강릉여인숙>/<순환하는 밤>/<편지> (0) | 2018.12.20 |











